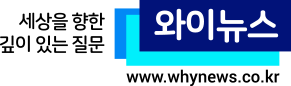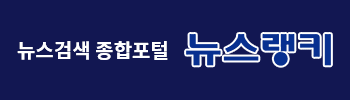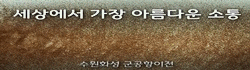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한차례 파동이 지나간 듯하다. 쉽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쉽게 잊는 것도 문제다.
본격 더위가 찾아오기 조금 이른 6월 초 파문은 시작된다. 앞선 6월 3일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 바닥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시 기자들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지도부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 그 현장에서 기사를 작성해 바로 송고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펴는 것은 통상 불가결이다.
같은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심사일언(深思一言) 해달라”며 당 소속 의원들의 막말에 당부를 전했다. 황 대표의 이 발언 불과 10여 분 뒤 한 총장은 ‘걸레질’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장은 논란이 일자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고생하는 친한 기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이라며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며 더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부탁한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후 회의장 안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열악한 취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걍 고생이 많네 한마디 하는 게 더 쉽겠다. 걸레질한다는 말을 누가 안쓰러워서 건네는 말이라고 생각하겠냐” “한국당 지지자로서 진짜 한숨만 난다. 지금 막말 프레임 씌우려고 민주당 벼르고 있는데 자꾸 거리를 던져주면 어떡하는가. 진짜 입조심 좀 하십시오” 등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자들은 사건이 터지면 달려간다. 그곳이 멀든 가깝든 신입 시절에는 데스크의 명령에 따라, 연차가 쌓이면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 공익에 우선하는 취재를 보통 진행하게 된다. 바닥에 앉아 옷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취재원의 목소리, 표정, 손짓 하나 놓치지 않으려 촉각을 곤두세운다. 필드에서의 몸싸움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자들에게 ‘걸레질’ 발언은 유쾌할 수 없다. 한 총장의 입장문에도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대체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한다. 세상의 지저분하고 치워야 할 사항과 사람에게 행하는 ‘걸레질’이라면 기자의 ‘걸레질’은 그 규모와 추진력에서 이미 차원이 다르다. 소수 기자들이 ‘기레기’로 분류되는 상황에서도 뜻있는 기자들의 바른 언론관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데 일조했다. 기자의 ‘걸레질’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