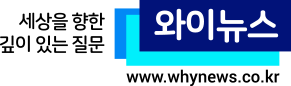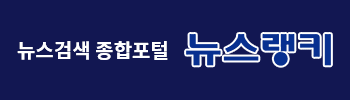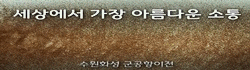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이영주 편집국장
[와이뉴스] 3주쯤 전이었다. 습관적(혹은 기계적)으로 sns(FaceBook)에 기사링크를 공유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로그인이 중지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왜지. 다채널로 원인을 찾아보았다. 계정 게시물의 성격이 ‘광고성이 짙은 경우’ 간혹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로그인이 중지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이의 신청을 보내고 짧게는 3일 내지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기다리면 로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얼굴 사진 또는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도가 약한 것이 본인 얼굴 사진이고 점층적으로 신분증 단계까지 있다는 것. 얼굴이 나온 증명사진을 첨부했다.
사흘 후, 거짓말처럼 다시 로그인 됐다. 그러고는 언제나처럼 알림창들이 휴대폰 상단에 표시되기 시작했다. ‘○○○님이 게시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님이 ○○○님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백하자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규모 인터넷언론 입장에서 sns가 중지된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팔다리 다 잘리는 것이요,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차포(車包) 떼고 장기판에 올라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 시군, 도 단위 기초·광역 단체, 심지어 청와대며 대통령까지도 sns로 홍보를 하는데 강소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sns로 홍보하는 것에(기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뉴스제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풀 죽지 말자 하던 차였다.
해당 sns 측에서 보자면, 최단 시간 내에 사용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이 이벤트는 꽤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sns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 대체로 기사 공유 용도로(애초에 그를 목적으로 계정을 생성했다) 활용했지만, 외에도 기쁜 일, 큰일, 작은일 심심찮게 ‘공유’하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sns와 본래의 자아(自我)를 동격화하고 있었다는 것.
현대사회 sns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타인의 기쁨 슬픔은 물론, 누군가의 탄생과 죽음, 가정사, 취미, 직업, 본인이 공개(직·간접적으로)한다면 거주지와 나이, 성별은 기본이고 전 연인의 안부까지도 sns에 다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회적관계(social network)를 맺고 본인의 필요(인맥, 정보, 홍보 등)을 무료(service)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편리함을 넘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체와 이미지 사이에서 방점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결론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부르주아는 성안의 사람, 사회 정치 경제적 입지를 가진 상류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다. 성 밖의 사람들은? 실제 프랑스혁명 전까지는 성안 사람들이라 해서 특별히 더 부유하지는 않았다고 전하기는 하나, 갑자기 sns 로그인이 중단(금지)됐을 때 더 이상 사회적 연결망에서 배제된 존재, ‘성 밖의 사람’이 된 심경이었다.
계정이 재개된 지금,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입이 금지’됐을 때의 상실감이 당혹스럽기 때문이다. 결심했다. sns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실감이 들지 않을 수 있게 됐을 때 다시 예전처럼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겠다고. 현재는 sns와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미지는 무척 중요하다. 사람은 소문에 죽고 소문에 사는 법. 이미지가 실체보다 강력하고 요긴할 때도 있다. 쇼윈도(show window)에 자신의 모습을 되도록 멋지고 빛나게 그럴싸하게 ‘진열’해야 ‘판매’가 성사된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