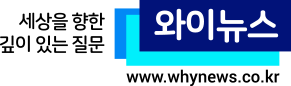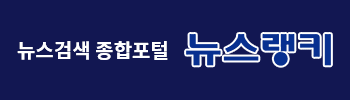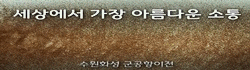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여기 두 건의 성범죄 사건이 있다. 두 건은 시간 간격을 두고 꽤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법원 판결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 빼고는 말이다.
첫 번째 사건. 2020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A씨 사건이다. 친구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낯선 30대 남성이 A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 드문 야산으로 데려갔다. 남성은 조수석에 앉은 A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A씨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혀끝 3cm가량이 절단됐다. 남성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번째 사건. 사실 이 건은 시간상으로 우선이다.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C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C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 사건 판결은 달랐다. 사건 직후 30대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검찰은 이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여성)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형법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정당방위를 정하고 있다. 그 정도가 설사 과했다 하더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것.
56년 전 판결은 왜 이와 달랐을까.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남성을 따라간 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였으며 입을 맞추게끔 하는 데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B씨는 2020년 5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심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법상 중상해죄 구성요건인 ‘불구’의 개념이 반드시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고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지점에서 강간죄 침해 법익인 ‘여성의 정조’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해자의 혀 일부가 잘려 발생하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법익을 더 무겁게 판단해왔다는 지적이 인다.
두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 아직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위,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의 자서전에서조차 “장난삼아 약물을 구해주는 일”을 명기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과제를 상기시킨다.
두 사건에서 가해 남성은 사건 직후 ‘피해자’로 둔갑했고 이는 ‘혀 일부의 절단’에서 기인한다. 정작 이들이 잘려야 할 건 그들 신체의 일부인 ‘혀’가 아니라 완력으로 여성의 성(性)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 미개하고도 야만적인 생각 자체이다.